새롭게 장사를 시작하시거나 장소를 옮겨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시기도 하는데요.
권리금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관례 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영업 가치인 권리금을 임대인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들어갈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쫓겨나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고,
또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는 권리금을 지불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자신이 영업을 하면서
쌓은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즉,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신규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월세 연체 여부 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밀렸다가 낸 것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만일 어느 한 시점에서 봤을 때 밀린 차임액이 월세 3기분에 달한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추후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치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혹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 전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기 힘듭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가 리모델링 및 재건축' 입니다.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의 정당한 사유는 3가지 밖에 없습니다.
|
1.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2. 건물 노후 또는 멸실로 인해 안전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 저희 사무소로 전화를 주시면서 임대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건물이 너무 오래되서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상의 이유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안전진단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내 건물인데 내 맘대로 사용도 못하느냐고
불평을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쌓은 영업적 가치이며, 만일 직접 사용하고 싶다면
상호 합의 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유도 없이 무작정 자신을 내쫓으려고만 한다면
분명히 법적 대응은 필요할 것 입니다.
- 임차인 H씨 사례 -
임차인 H씨는 2010년부터 고시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 17년 12월까지 연장 됐는데요.
사업의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상가가 16년 3월에 매매 되었고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큰 무리 없이 계약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 H씨는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계약만료를 불과 2달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건물주는 해지를 통보하며 '앞으로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갱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아닌 5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갱신요청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H씨는 자신이 수년 간 영업하며 쌓은
영업 가치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H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이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은 'H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로 인해 H씨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H씨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임대인 측은 '5년 이상 영업한 사람에게 권리금까지
보호해준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무소는 분쟁 초반부터 함께 하면서 H씨가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은 점 등 법리를 구성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2018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H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 6,800만 원을 지급하라'
담당 재판부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해 재산권을 형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리금 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으로 제정해뒀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정해둔 조항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통하셔야 합니다.
'법률정보 > 상가,임대차,권리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절차 빠르게 (0) | 2019.11.05 |
|---|---|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얼마나 가능할까? (0) | 2019.08.19 |
| 권리금 보호가 안되는 경우, 어떤게 있을까 (0) | 2019.07.08 |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 여부는? (0) | 2019.07.04 |
| 권리금이란, 행사방법은 (0) | 2019.07.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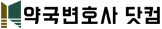











댓글